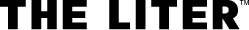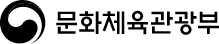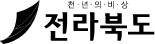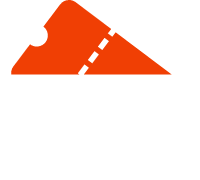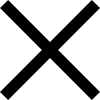<괴물, 유령, 자유인>은 스피노자와 퀴어를 연결시킨 영화다. 잘 알다시피 스피노자는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의 철학을 주장하고 추구한 철학자다. 그런 사상을 실천한 까닭에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단자로, 기독교도 사이에서는 무신론자 유대인으로 낙인찍혀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괴물’ ‘유령’ ‘자유인’ 세 챕터로 구성된 이 영화는 성심과 은수, 두 동성커플과 스피노자를 연기하는 배우 성철의 사연을 연결시킨다. 일반적인 서사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 까닭에 각각의 챕터는 인과 관계에 따라 이어지지 않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이미지와 관념적인 내용의 자막들이 이야기 곳곳에서 끼어든다. 이 영화는 <아모르, 아모르 빠띠> <스피노자의 편지> 등 단편 작업을 통해 오랫동안 퀴어를 다뤄온 홍지영 감독이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더욱 확장해 내놓은 첫 장편 연출작이다. 어릴 때부터 시네필이던 홍 감독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관객과 직접 만나 그들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image:1;}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
평소 스피노자의 철학을 접하면서 퀴어를 접목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왔다. 처음 기획할 때 세 개의 단편으로 스피노자와 퀴어를 연결시키되, 일반적인 내러티브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제작비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괴물’ ‘유령’ ‘자유인’ 단편 세 편을 각기 나눠 찍은 뒤 후반작업에서 하나로 합쳤다.
-괴물과 유령 그리고 자유인, 세 가지 키워드를 언뜻 보면 연결고리가 없어보이는데.
세상의 어떤 질서 안에서 괴물이나 유령은 혐오스럽거나 낯선 모습, 미지의 존재를 뜻하는 말이 아닌가. 그건 누구에게나 내재된 모습이지 않나. 그점에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인 퀴어를 괴물, 유령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image:2;}
-스피노자 철학의 어떤 점에서 퀴어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나.
잘 알려진대로 스피노자는 자유를 추구한 까닭에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단자로, 기독교도 사이에서는 무신론자 유대인으로 낙인 찍혀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산 철학자다. 그의 철학은 그가 살아온 삶을 닮아 자유로웠다. 그런 스피노자의 삶과 철학을 통해 퀴어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스피노자의 철학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영화에선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성심과 은수는 동성 커플인데 둘의 관계가 불안해보인다. 성철은 배우로, 스피노자를 연기해 무대에 오르려고 한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피노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스피노자는 세 사람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존재이고, 성철을 통해 관념이나 개념으로 존재하는 스피노자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성심과 은수의 관계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해보이는데.
퀴어에선 개개인의 성정체성만큼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둘 사이에서 관계가 인정되면서 힘을 얻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성심과 은수의 관계가 불안정해보이는 이유가, 성심이 둘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독으로서 두 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안에서 책임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뜸 두 사람을 해피엔딩으로 그려내거나 헤어지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둘의 관계가 다소 모호해보이는 것도 그래서고, 그게 현실인 것 같다.
-그 두 사람은 당신의 전작인 단편영화 <스피노자의 편지>(2018, 주인공 성심은 김교수의 논문을 대필하면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고, 과거 연인 은수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편집자)에서 계속 이어지는 듯하다.
맞다. <스피노자의 편지>를 재구성해 이 영화에 합친 것이다. 그점에서 <스피노자의 편지>는 <괴물, 유령, 자유인>에 속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극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고려하면 성철이 준비하는 희곡의 주인공으로 적합해보인다.
원래는 스피노자를 괴물의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했었다. 생전 그가 파면 당했을 때 파면된 내용을 보면 누구도 스피노자 옆에 가서는 안 되는 등 사회에서 제약이 무척 많았다. 그런 그의 삶 때문에 우리가 본 적 없는 괴물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어느 사회에서나 질서에 속하지 않은 존재나 미지의 존재들을 괴물이나 마녀로 규정하지 않나. 오래 전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을 괴물이나 마녀로 규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image:3;}
-꿈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이미지와 그것을 은유하는 대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현실은 마치 꿈 같고, 꿈은 현실과 같다고 하지 않나.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서 꿈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은 다양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헤게모니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려고 한다. 그러한 질서가 현실이 아닌 꿈일 수 있다. 또, 유령이 등장하는 장면은 꿈이나 환상처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점에서 <괴물, 유령, 자유인>은 영화 혹은 영화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꿈이나 상상인 것 같은 이미지들이 이야기 곳곳에서 불쑥 끼어든다.
이야기가 꼭 인과적으로 전개될 이유는 없고, 또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일반적인 서사에 따라 진행되는 드라마는 관객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이 영화는 관습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지, 자막 등 여러 장치들을 통해 거리두기를 시도해 관객들이 시시때때로 영화를 사유하며 관람하도록 했다.
-전세계적으로 페미니즘 바람이 불고, ‘미투’가 나오는 최근의 변화와 사회적 움직임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나.
여성 혐오의 시대에서 시의성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을 혐오하는 음직임 또한 많아 2장 ‘유령’에서 어둡고 롱숏이 많은 이미지를 통해 불안감과 답답함을 표현하려고 했다. ‘유령’만 봐도 퀴어를 좀 더 은유적으로 다루었는데, 그간 사회가 많이 변화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미지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괴물’ ‘유령’ ‘자유인’ 세 편까지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점에서 이 영화는 오랜 관심사인 퀴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겠다.
맞다. 퀴어에 대한 생각을 모색해왔다. <스피노자의 편지> <아모르, 아모르 빠띠> 등 단편에서 이번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각이 더욱 확장된 것 같다.
-차기작은 무엇인가.
다음 작품은 영화라는 매체를 다루는 영화가 될 것 같다. 공동 연출작으로, 실험영화와 다큐멘터리가 혼합된 형식이 될 것 같다. 개인 연출작은 퀴어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글 김성훈·사진 백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