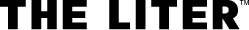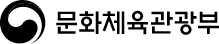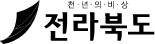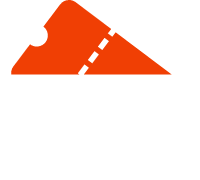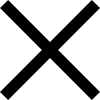{image:1;}
한국경쟁에 오른 감독들 사이에서 단연 많이 언급된 작품은 조은 감독의 <사당동 더하기 33>(이하 <사당동 33>)이었다. <사당동 33>은 가난한 북한 이주민과 농촌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사당동 주민 정금선 할머니의 4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1986년부터 녹음기로 정금선 할머니의 목소리를 담았던 사회학자 조은은 1997년부터 카메라를 구해 금선 할머니네 가족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사당동 33>은 당시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기록이다. 그 사이 7살이었던 막내 손자 덕주는 마흔이 되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조은 감독과 함께 작업했던 이들은 성장해 다큐 감독, 방송국 카메라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누군가는 착실한 연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대의 다큐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작품 <사당동 33>을 만든 조은 감독을 전주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image:2;}
-전작 <사당동 더하기 22>(이하 <사당동 22>)로 2010년에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았다. 당시와 이번의 작업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하다.
<사당동 22>는 철거 과정이 훨씬 중요한 작품이었다. <사당동 33>은 거기에 단순히 11년을 더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컨셉을 잡은 것이다. 가난한 가족과 가난을 연구하는 연출가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난다. 익숙한 다큐 문법을 따르지도 않고 기승전결이 있지 않다. 아마 내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큐의 문법을 해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출한 장면은 없고 가족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촬영했다. <사당동 22> 다 찍고 나니까 가족이 “이제 교수님 안 오시는 거에요?”라고 하더라. “안 오지는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하지만 계속 찍을 거라고 말하진 않았다. 가족이 신촌에서 열린 서울국제영화제에 참석해서 다큐를 봤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고민됐기 때문이다. 가족과 왕래했지만 <사당동 22>가 나오고 난 뒤에 6개월쯤 카메라를 쉬었다.
-화면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느껴진다. 중간에 화면비가 바뀌고 영상 화질 차이도 느껴진다.
그동안 총 여섯 대의 카메라를 쓴 것 같다. 처음 사용한 건 베타캠이란 아날로그 카메라였다. 그 다음으로는 파나소닉 P2 카메라를 썼다. 8mm, 6mm 테이프를 넣어 촬영했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았다.(웃음) 막 대중화되기 시작한 소형 디지털 카메라도 섞어 썼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FHD 화질의 영상을 SD카드에 저장하는 핸디캠으로 촬영했다. 처음 촬영할 때 동국대 영화학과 학생들과 함께했는데 영화에서 정말 많은 가난을 봤지만 진짜 가난한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 촬영자가 어딜 찍어야 할지 몰라 카메라가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한다.
-<사당동 22>에 이어 상징적으로 <사당동 33>을 완성하고 싶었을 것 같다.
<사당동 22>를 완성했을 때 한 방송국의 초청을 받아 대담에 나갔는데 <사당동 더하기 44>를 만들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웃으면서 “<사당동 더하기 44>는 자신 없고 <사당동 33>은 모르겠네요”라고 답했다. 그 나이까지는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당동 필드연구에 들어간 지 11년 만에 카메라를 잡았고, 그로부터 12년 만에 <사당동 22>를 완성했다. 그리고 11년이 흐른 지금 <사당동 33>을 만들었다. 다큐를 보면, 33년이란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가난의 측면에서 보자면 33년이란 세월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이 쳇바퀴 돌듯이 돈다. 전작에서도 그랬지만 숫자에 방점을 안 찍고 싶다. <사당동 33>은 가난한 과거를 담은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작업이었으면 한다.
-목회자의 꿈을 가진 첫째 손자 영주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참히 깨지더라. 가난의 구체를 본 것 같다. 작업 중에 조은 감독이 본 가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얼버무리는 언어. 지역 언어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사회에 계급 언어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다큐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다. 이 영화에는 우리말 자막이 있다. 우리말 자막 없이는 도저히 참고 볼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당동 22>때도 할머니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어서 한글 자막을 달았는데, 그땐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자 세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계급 언어구나 싶었다. 이들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일이 없다. 그래서 발음이 불분명하고 항상 웅얼거리듯이 말한다. 세련된 언어로 말할 필요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image:3;}
-전작 <사당동 더하기 22>(이하 <사당동 22>)로 2010년에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았다. 당시와 이번의 작업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하다.
<사당동 22>는 철거 과정이 훨씬 중요한 작품이었다. <사당동 33>은 거기에 단순히 11년을 더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컨셉을 잡은 것이다. 가난한 가족과 가난을 연구하는 연출가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난다. 익숙한 다큐 문법을 따르지도 않고 기승전결이 있지 않다. 아마 내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큐의 문법을 해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출한 장면은 없고 가족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촬영했다. <사당동 22> 다 찍고 나니까 가족이 “이제 교수님 안 오시는 거에요?”라고 하더라. “안 오지는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하지만 계속 찍을 거라고 말하진 않았다. 가족이 신촌에서 열린 서울국제영화제에 참석해서 다큐를 봤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고민됐기 때문이다. 가족과 왕래했지만 <사당동 22>가 나오고 난 뒤에 6개월쯤 카메라를 쉬었다.
-화면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느껴진다. 중간에 화면비가 바뀌고 영상 화질 차이도 느껴진다.
그동안 총 여섯 대의 카메라를 쓴 것 같다. 처음 사용한 건 베타캠이란 아날로그 카메라였다. 그 다음으로는 파나소닉 P2 카메라를 썼다. 8mm, 6mm 테이프를 넣어 촬영했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았다.(웃음) 막 대중화되기 시작한 소형 디지털 카메라도 섞어 썼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FHD 화질의 영상을 SD카드에 저장하는 핸디캠으로 촬영했다. 처음 촬영할 때 동국대 영화학과 학생들과 함께했는데 영화에서 정말 많은 가난을 봤지만 진짜 가난한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 촬영자가 어딜 찍어야 할지 몰라 카메라가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한다.
-<사당동 22>에 이어 상징적으로 <사당동 33>을 완성하고 싶었을 것 같다.
<사당동 22>를 완성했을 때 한 방송국의 초청을 받아 대담에 나갔는데 <사당동 더하기 44>를 만들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웃으면서 “<사당동 더하기 44>는 자신 없고 <사당동 33>은 모르겠네요”라고 답했다. 그 나이까지는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당동 필드연구에 들어간 지 11년 만에 카메라를 잡았고, 그로부터 12년 만에 <사당동 22>를 완성했다. 그리고 11년이 흐른 지금 <사당동 33>을 만들었다. 다큐를 보면, 33년이란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가난의 측면에서 보자면 33년이란 세월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이 쳇바퀴 돌듯이 돈다. 전작에서도 그랬지만 숫자에 방점을 안 찍고 싶다. <사당동 33>은 가난한 과거를 담은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작업이었으면 한다.
-목회자의 꿈을 가진 첫째 손자 영주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참히 깨지더라. 가난의 구체를 본 것 같다. 작업 중에 조은 감독이 본 가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얼버무리는 언어. 지역 언어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사회에 계급 언어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다큐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다. 이 영화에는 우리말 자막이 있다. 우리말 자막 없이는 도저히 참고 볼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당동 22>때도 할머니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어서 한글 자막을 달았는데, 그땐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자 세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계급 언어구나 싶었다. 이들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일이 없다. 그래서 발음이 불분명하고 항상 웅얼거리듯이 말한다. 세련된 언어로 말할 필요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글 배동미·사진 백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