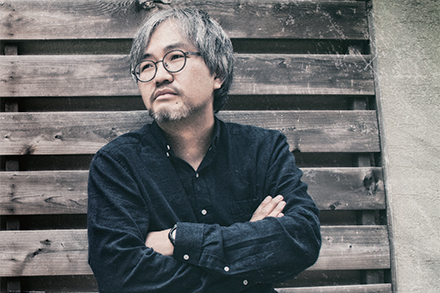
Q.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프리랜서 PD로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기획 아이템을 찾다가 대구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한 두 할머니의 영상을 보고 바로 꽂혔다. 경북 영덕군이라는 대략적인 주소만 들고 무작정 찾아갔다. 그렇게 처음 만나 뵙고 만든 게 OBS <여보게, 내 영감의 마누라>(2009, 독립제작사협회 우수작품상, 제3회 독립PD 다큐부문 최우수상 수상)였다. 이후 두 분을 좀더 찍어보고 싶어졌다. 성격부터 외모, 식습관까지 모든 게 정반대인 두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Q. 꼬장꼬장한 막이 할머니, 낯을 가리는 춘희 할머니의 섭외가 쉽지는 않았겠다. 어떻게 두 분을 설득했나.
방송 촬영 때만 해도 짧은 기간이라 어렵지 않게 섭외가 됐다. 하지만 영화 촬영을 위해 다시 만나 뵈었을 땐 막이 할머니께서 더는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 지역 방송으로 본인들 이야기가 계속 방영되니까 사람들이 ‘누가 퍼스트다, 누가 세컨드다’라고 말했고 그게 영 듣기 싫으셨던 거다. 그래도 계속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 드렸다. 두 분뿐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5일장 가실 때는 운전기사 노릇도 했다. 그렇게 은근 슬쩍 눌러앉았다.
Q.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 촬영한 걸로 안다. 할머니들과 정이 많이 들었겠다.
촬영을 끝내고 인사차 들렸을 때다. 원래 춘희 할머니는 악수도 잘 안하실 정도로 스킨십을 싫어하신다. 내 이름도 잘 안 부르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먼저 내 손을 잡으시며 “이제 가면 안 오지?” 하시더라. 특히 춘희 할머니랑 정이 많이 들었다.
Q. 혹시 두 할머니도 영화를 보셨나.
지금(5월1일) 전주로 오고 계신다. 영화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첫 상영을 통해 영화를 보시고 관객과의 대화 때 인사도 하실 거다. 두 분의 반응이 정말 궁금하다. 예측불허인 춘희 할머니께서 영화 보시다가 “왜 이리 캄캄하노” 하며 나가실까봐 걱정이다. (웃음)
Q. 곁에서 지켜보니 두 할머니가 어떻게 지금까지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것 같던가.
막이 할머니는 대인배이시고 춘희 할머니는 어린 아이 같다. 그런데 가만 보면 춘희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막이 할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온 건 아닌 것 같다. 때론 춘희 할머니가 정말 맞는 말을 하시기도 하고 막이 할머니가 하라고 하는 일을 잘 해내고 싶어도 하신다. 춘희 할머니가 되레 막이 할머니의 삶의 버팀목이 돼준 점도 있다. 두 분 사이에는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애틋함이 있는데 그걸 담아보고 싶었다.
Q.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두 할머니가 눈을 맞추고 서로를 바라보는 엔딩 장면이 유독 인상적이다.
편집할 때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2년간의 촬영분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본 건 그게 유일했다. 늘 나란히 앉아 각자 앞만 봤는데 말이다. 엔딩은 이거다 싶더라. 그런데 너무 짧게 서로를 보셔서 속으로 1초만 더 보시지 했다. (웃음)
Q. <춘희막이>는 장편 영화 데뷔작이다. 그전에는 주로 방송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는데.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91학번)를 졸업하고 방송아카데미에 다녔다. 1990년대 말 배창호 감독님의 연출부 막내로 일을 시작했다. 감독님께서 식사하시고 사무실 근처인 인왕산에 등산을 가시면 보디가드로 따라가는 게 내 일이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준비하시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그길로 생계를 위해 방송 일을 시작했다.
Q. 앞으로도 꾸준히 영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인가.
영화는 계속 하고 싶다. 꼭 할 거다. 하반기에 <춘희막이>가 개봉한다. 다음에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출처: 씨네21 글: 정지혜 사진: 백종헌